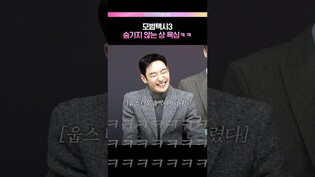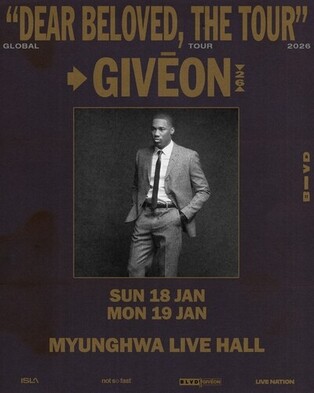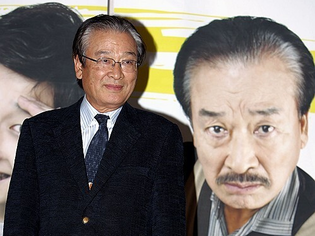4·3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 각종 개발 속에 사라져
의미와 가치 새롭게 해석 다양하게 활용 '전통 계승'
 |
| ▲ 제주 용수리 방사탑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바닷가에 있는 방사탑의 모습.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제주도 민속문화재다. 2022.3.20 |
 |
| ▲ 제주 용수리 방사탑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바닷가에 있는 방사탑의 모습.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제주도 민속문화재다. 2022.3.20 |
 |
| ▲ 서귀포 대정읍 인성리 방사탑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에 있는 제주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방사탑의 모습. 2022.3.20 |
 |
| ▲ 서귀포 대정읍 인성리 방사탑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에 있는 제주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방사탑의 모습. 2022.3.20 |
 |
| ▲ 제주 4·3 해원방사탑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
 |
| ▲ 제주4.3평화공원의 해원 방사탑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2일 오후 제주4.3평화공원 입구에서 제주 현무암으로 만든 4m 규모의 해원 방사탑 2기가 건립돼 제막식이 열렸다.<<전국부 기사 참조>> khc@yna.co.kr |
 |
| ▲ '제주의 혼불' 방사탑 완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
[다시! 제주문화] (31)재앙 막는 방사탑…"이제는 평화·희망의 상징"
4·3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 각종 개발 속에 사라져
의미와 가치 새롭게 해석 다양하게 활용 '전통 계승'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돌·바람·여자가 많아 삼다도(三多島)로 불리는 제주.
화산섬 제주 지천으로 널린 화산석, 즉 돌은 제주 사람들에게 극복해야 할 대상이자 생활의 원천이었다. 삶의 지혜와 예술적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제주 돌 문화는 그 자체가 제주도 문화다.
20일 마을의 허(虛)한 곳을 막아 액운을 없애고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세워진 제주 방사탑의 의미와 오늘날의 가치를 들여다본다.
◇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방사탑
제주를 돌아다니다 보면 해안가 또는 마을 어귀 등에 돌을 쌓아 올린 원뿔 모양의 탑을 흔히 볼 수 있다.
돌탑 위에는 새 또는 사람 모양의 돌 등이 세워져 있어 범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는다.
바로 방사탑(防邪塔)이다.
'재앙을 막아달라'는 간절한 기원을 담아 제주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쌓아올렸다.
제주 사람들은 이 돌탑을 말할 때 답(탑; 塔) 또는 거욱, 가마귀, 하르방, 걱대, 액탑 등 다양하게 불렀다.
제주 문화유산을 답사·연구해 온 강창언 제주도예촌장은 자신의 저서 '제주박물지 논문편'에서 "'방사탑'이라고 하면 (마을주민들이) 모르는 일이 흔했고, 보충 설명을 해야 이해할 정도"라며 "기록하는 사람들이 방사용(防邪用, 나쁜 기운을 막는 용도의) 탑을 '방사탑'이라고 줄여 표기해 굳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방사탑이란 명칭은 제주지역 각 마을마다 다양하게 부르는 이름을 포괄한 일종의 학술적 용어인 셈이다.
방사탑과 관련해 제주에는 다양한 일화가 전해 내려온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바닷가에 있는 절부암에 얽힌 이야기를 보면 방사탑의 기능과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
조선 말엽 차귀촌에 살던 고씨 부인의 남편은 고기잡이를 나갔다 거센 풍랑을 만나 불귀의 객이 됐다. 고씨는 남편의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밤낮으로 해안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자신도 자결하고 말았다.
고씨가 자결한 바위가 바로 절부암인데 그 일대에 방사탑이 세워졌다.
고기잡이배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잦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해안가로 떠밀려 들어오는 일이 많아지자 사람들은 바다 쪽인 서쪽이 허(虛)하다고 여겨 용수리 바닷가에 방사탑을 쌓았다.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마을 방사탑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진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모슬포에 신병훈련소가 세워진 후 훈련소 막사를 짓는 과정에서 인성리의 거욱(방사탑)을 헐어 그 돌덩어리로 막사를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거욱이 없어지자 뒤이어 수많은 소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등 마을에 재앙이 닥쳤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1959년 집마다 쌀 한 되씩을 모아 그 돈으로 방사탑을 복원했다고 한다.
제주 각 지역의 방사탑에는 저마다 다양한 사연이 담겨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에는 총 49기의 방사탑이 남아있다.
이중 17기(제주시 11기, 서귀포시 6기)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고, 2기(제주시 1기, 서귀포시 1기)가 향토 유형 유산의 형태로 지정됐다. 향토 유형 유산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향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도 조례로 보호하는 문화유산을 일컫는다.
나머지 30기(제주시 20기, 서귀포시 10기)는 비지정 문화재로 남아있다.
강정효 작가의 저서 '제주 거욱대'에 따르면 과거 제주도 내 4개 시·군 103개 마을에 방사용 돌탑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는 지명이 있다. 과거 제주도 대부분의 마을은 아닐지라도 상당수 마을에 방사용 돌탑이 세워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4·3사건과 6·25전쟁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과 각종 개발 과정에서 많은 방사탑이 사라졌다.
◇ 슬픔 딛고 평화·희망의 상징으로 거듭
제주 4·3 50주년을 맞은 지난 1998년 4월 '4·3 해원 방사탑'이 완성됐다.
4·3 유족들은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한 사람 한 돌 쌓기' 형식으로 8t 트럭 3대분의 제주 현무암을 4월 3일부터 보름 동안 정성스레 쌓아 올렸다.
높이 7m, 밑 둘레 15m, 직경 4.5m 규모다.
마지막으로 탑 맨 위에는 동그란 모양의 돌을 얹었다.
화해와 상생을 의미한다.
유족들은 방사탑을 쌓으며 억울하게 희생된 부모, 형제들의 영혼을 달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없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했다.
'재앙을 막아달라'며 쌓았던 방사탑의 그 기능을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커다란 아픔이었던 4·3으로 확대했던 것이다.
이곳 4·3 해원 방사탑에서는 해마다 4·3을 앞둔 4월 1일 제의를 봉행한다.
10년 뒤 2008년 4월 2일에는 전국의 옛 형무소 터와 학살터를 떠돌던 행방불명인들의 혼백을 60년 만에 제주4·3평화공원 내 평화기념관에 안치했다.
당시 4·3 행방불명인 진혼제를 거행하며 이를 기념해 공원 입구에 제주 현무암으로 만든 4m 규모의 '해원 방사탑' 2기가 세워졌다.
원통한 마음을 푼다는 뜻의 '해원'(解寃).
유족과 희생자들의 아픔이 일순간에 풀릴 리 만무하다.
다만, 이 방사탑에는 후대 사람들이 4·3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희망을 기원하며 혹시나 닥칠지 모를 미래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현대 들어 방사탑의 활용도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2001년에는 새천년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가 벌어졌다.
2001년 1월 1일 0시에 제주시 사라봉공원 모충사 경내에서 도민 1천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하르방 타임캡슐 매설식이 열렸던 것.
타임캡슐 속에는 먼 훗날에도 옛 제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17개 분야 590점의 유물이 담겼다.
타임캡슐은 1천년 후인 서기 3001년에 개봉될 예정이다.
당시 제주시는 매설한 땅 위에 지름 7.5m, 높이 9m 크기의 거대한 방사탑을 쌓고, 꼭대기에 '제주의 혼불'을 밝혔다.
1천년간 제주를 지켜줄 '제주의 혼불 방사탑'이다.
이 혼불은 시간여행을 하며 평화와 번영의 제주 미래를 밝히게 된다.
이외에도 1천100여석의 노천 객석을 갖춘 제주의 대표 야외 공연장인 탑통 해변공연장 등 주요 건물이 방사탑 모양으로 지어졌고, 소규모 공원과 해안가 카페, 가정집 정원 등에까지 방사탑 모양의 돌탑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제주에서 열린 지구촌 '문화올림픽' 제3회 제주 세계 델픽대회의 메달에도 방사탑 문양이 들어갔다.
주최 측은 델픽대회 경연에서 탁월한 예술 기량을 선보인 수상자들에게 수여할 메달 디자인으로 제주도민들이 액(厄)을 막기 위해 돌로 쌓았던 방사탑의 표면 문양을 삽입했다.
이처럼 방사탑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하고 다양하게 활용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전통을 계승하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은선은 '제주도의 답과 거욱대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제주도민들은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을 정복하려는 저항적인 태도가 아닌 대자연의 혜택에 순응하는 자세로 소박하고, 협조적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순박한 미를 창출했다"며 "이 조형물(방사탑)의 신앙체계와 가치를 밝힌다는 것은 그 속에 내재하는 제주도 사람들의 정신적 가치를 발견하고 민간의 조형적 흐름도 함께 파악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제주거욱대'(강정효 저), '제주박물지 논문편'(강창언 저), '화산섬, 돌 이야기'(강정효 저), '제주도의 답과 거욱대에 관한 연구'(정은선) 등 책자와 논문을 인용해 제주의 방사탑을 소개한 것입니다.]
(끝)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