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곽용환 고령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인터뷰] 가야 문화권 사업 기틀 다진 곽용환 고령군수
경북 고령군 15년간 가야문화권협의회 이끌고 경남 김해시에 바통 넘겨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곽용환 경북 고령군수는 25일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과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등 가야 문화권 번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곽 군수는 2010년부터 10년간 가야문화권협의회 의장을 맡아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최근 허성곤 경남 김해시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그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가야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조사 연구의 원동력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곽 군수와 일문일답.
-- 고령군이 15년간 이끈 가야문화권협의회를 김해시가 새로 맡게 된 이유는.
▲ 2005년 결성 당시부터 고령군이 협의회를 맡았는데 나는 2010년부터 의장으로 일했다. 10년간 5번 연임하며 제3∼7기를 이끌다 보니 다른 지자체가 새로운 시각에서 조직을 운영해 보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허 시장에게 인계했다. 가야문화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밑그림이 확정되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어 보람을 느낀다.
-- 가야문화권협의회는 어떤 조직인가.
▲ 가야문화라는 공통적 역사 인식을 공유하는 지자체가 상호 발전하며 영호남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 2월에 결성했다. 현재 영호남 5개 광역시·도와 26개 시·군이 참여해 인구 385만명, 면적 1만6천942㎢로 전국 17%에 해당하는 명실공히 최대 행정협의회다.
-- 고령군이 협의회 결성을 주도할 당시 상황은.
▲가야 문화권은 5개 시·도 26개 시·군에 고루 분포해 중앙부처의 관심과 예산지원 부족, 국민적 인식 저조 등으로 각 지자체가 단독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신라·백제 문화권과 달리 서술된 정사가 없이 잊힌 역사로 남아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고령군은 가야 문화권의 체계적인 발전, 영호남 내륙 경제·문화 거점 조성, 영호남 상생·동반성장을 위해 협의회 결성을 적극 추진했다.
--협의회 회원 수가 결성 초기보다 많이 늘었는데.
▲ 처음엔 4개 시·도와 10개 시·군이 참여했는데 최근 경남 진주시가 합류해 회원도시가 26개로 늘었다. '가야'라는 공통분모 아래 많은 지지체가 참여하면 시·군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공통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어 함께 발전할 수 있다. 가야 문화권 국정과제 추진,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 교류 확대 등 현안을 큰 틀에서 추진할 수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 가야 고분군이 2020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됐다.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는.
▲ 가야 고분군은 서기 1∼6세기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있던 가야의 7개 고분으로, 당시 주변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와 병존하면서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한 가야 문명을 실증하는 독보적인 증거다. 해안과 내륙에 분포한 각 정치체 최상위 지배층 고분의 지리적 분포, 입지, 묘제, 부장품을 통해 동질성을 바탕으로 상호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한 가야연맹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독특한 유형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 가야 문화권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 26개 시·군이 가야 문화권 조사와 연구, 정비 등 국정과제 추진,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제정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제정 및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밖에 관련 학술 연구, 합동 워크숍·포럼·세미나 개최, 영호남 가야문화 한마당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 다른 지역 가야문화와 비교해서 고령의 특징은.
▲ 고령의 대가야는 서기 5∼6세기 전기 가야연맹을 주도한 금관가야가 세력이 약해질 때 내륙산지 풍부한 철 자원을 바탕으로 후기 가야연맹을 주도했다. 서쪽 합천과 함양, 남원은 물론 섬진강 하구 하동과 순천 등에서도 대가야 문화 흔적을 확인 할 수 있다. 중국 남제와 교류한 사실도 있다. 특히 1977년 고령 지산동 고분군 발굴은 가야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조사·연구의 원동력이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끝)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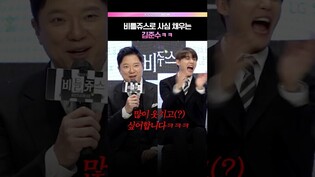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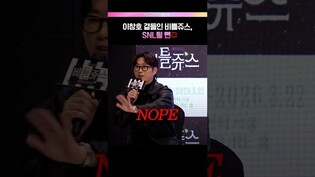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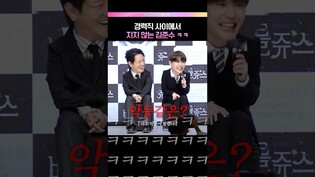

![[가요소식] 존박, 8년만 단독 콘서트](/news/data/20251222/yna1065624915961730_1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