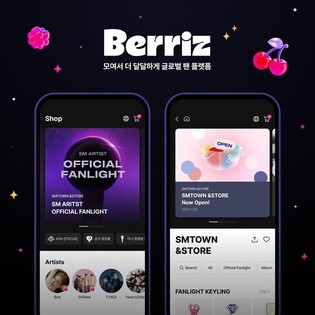|
| ▲ 조선총독부 건물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
| ▲ 중국 뤼순감옥발물관에 재현된 일제 고문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
| ▲ 조선총독부의 고문 감금실로 추정 지하공간 [연합뉴스 자료사진] |
박휘병 고문치사 90주기…조선총독에 위자료 청구·인권 새지평
국가 폭력의 민사책임 법정에서 처음 따져…"조선인 인식변화 보여준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독립운동가 박휘병(1905∼1933)이 일제의 고문으로 순국한 지 13일 90주년을 맞이했다.
국가보훈처가 공개한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따르면 박휘병은 신간회 덕원지회에 가입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좌우 합작에 힘쓰는 등 사회운동을 하다 경찰에게 모진 고문을 당했다.
28세로 짧은 생을 마쳤지만, 그의 유산은 되새길 부분이 있다.
특히 유족이 조선 총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인권 의식의 지평이 넓어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변은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교수는 역사학연구소의 학술지 '역사연구' 46호에 최근 실린 논문 '1920~30년대 항일운동가 고문치사 문제와 박휘병 사건'에서 그의 순국과 유족의 대응을 조명했다.
논문에 따르면 3·1운동으로 무단 통치의 한계를 인식한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표방한 1920년대 이후에도 항일 지사 등에 대한 고문이 지속됐다.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총독으로 부임한 1919년 8월부터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 7월 사이에 고문치사로 순국한 독립유공자는 국가보훈처 기록에서 파악되는 이들만 125명에 달할 정도였다.
박휘병 역시 고문치사 희생자 중 한 명이다.
1905년 12월 3일생인 그는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한 뒤 광성학교 교사, 동아일보 원산지국 기자 등으로 활동하며 덕원과 원산 등에서 청년운동과 농민운동을 주도했다.
박휘병은 1930년 8월 3일 이른바 '원산 격문 사건'으로 붙잡혔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덕원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하고 10여곳에 농민야학을 개설하는 등 활발하게 운동하다 1933년 3월 12일 이른바 '덕원농민조합 사건'에 연루돼 다시 체포됐다. 다음 날 오후 4시께 사망했다.
부검 결과 상해치사, 즉 구타와 고문에 의한 사망으로 드러났다.
취조를 담당했던 고등계 형사 3명은 파면됐고 독직 및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1명만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받고,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풀려났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유족은 판결 후 석달 가량 지난 1933년 9월 22일 고문치사에 대한 위자료 5천원을 지급하라며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당시 조선 총독을 상대로 경성지법에 소송을 냈다.
고문치사는 직무 수행 중 불법 행위라는 인식에 따라 당시 한반도 통치 책임자를 상대로 사실상 국가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이 사건은 제소 다음 날 주요 신문에 일제히 보도됐고 "조선 사회운동이 일어난 이후 처음으로 있는 희귀한 소송사건"으로 평가받았다.
유족의 소송대리인은 "국가통치권과 같은 공권 행사에 의한 불법행위라도 그 발생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은 사권이니만치 민법 제715조에 의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저명한 법률 전문가 사이에 논쟁도 벌어졌다.
미노베는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가와나와 오다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문제라고 봤다.
미노베는 헌법학자로 도쿄제국대 교수였던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 1873∼1948)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와나는 민법 전문가이며 도쿄제국대 교수를 지낸 가와나 가네시로(川名兼四郞, 1875∼1914), 오다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 판사를 지낸 오다 요로즈(織田萬, 1868∼1945)로 보인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유족이 항소하지 않아 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패소했지만, 당시 소송이 "최초라는 의미, 법리상 논쟁의 의미를 넘어, 193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평범한 조선인이 국가 폭력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논문은 규정했다.
이어 "식민지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근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자유로운 개인의 존재와 이들의 인권 의식의 성장,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발전이 있었음을 보여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