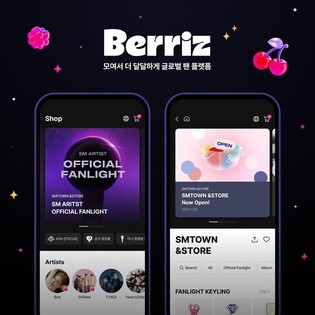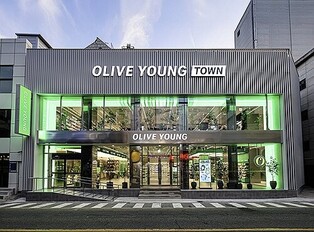"중건 당시 벽화 부착하는 장지 설치…그림은 일본인이 새로 그린 듯"
 |
| ▲ 보물 '경복궁 사정전'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
| ▲ 사정전 쌍룡도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
| ▲ 사정전 내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
| ▲ 경복궁 사정전 내 '쌍룡도' 관련 과거 사진 윗줄은 1986년 '쌍룡도' 수리 당시 장지 벽에서 그림을 떼는 장면과 장지 후면의 배접지 모습. 아랫줄은 2000년 철거 모습과 이후 그림틀을 분리하는 모습 ['고궁문화' 학술지 15호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왕의 집무실' 경복궁 사정전의 쌍룡도는 왜 원본을 떼어냈을까
학술지 '고궁문화'에 설치 배경·제작 시기 등 검토한 논문 실려
"중건 당시 벽화 부착하는 장지 설치…그림은 일본인이 새로 그린 듯"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경복궁 사정전(思政殿)은 경복궁 창건 당시 지어졌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됐고 조선 말기인 1867년에 중건됐다.
왕이 평소에 거처하며 정사를 논하고 문신들과 경전을 강론하던 건물이다.
왕에게 깊이 생각해 정치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름 지은 건물에는 왕이 앉던 자리인 어좌(御座) 너머로 가로 477㎝, 세로 287㎝ 크기의 큰 그림이 있다.
두 마리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 듯한 '쌍룡도'(雙龍圖)다.
이곳이 왕의 자리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식 그림으로 여겨지는 쌍룡도는 언제 제작된 것일까.
5일 학계에 따르면 박윤희 국립문화재연구원 미술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는 국립고궁박물관이 펴내는 학술지 '고궁문화' 최근호에 실은 논문에서 "1867년 경복궁 중건 당시에 그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학예연구사는 그림 속 용의 형상, 화풍, 사용한 재료 등을 검토한 뒤 "지금의 벽화는 조선 왕실의 그림 의장을 소재로 일본인이 새롭게 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2000년에 쌍룡도 벽화 원본을 떼어냈을 당시 제작 시기와 제작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짚었다. 그림의 이색적인 화풍이 왕실 그림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그림 원본은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지금 걸려 있는 그림은 현수막 형태로 출력한 영인본(影印本·원본을 사진이나 기타 방법으로 복제한 것)이다.
박 학예연구사는 쌍룡도 벽화 속 용의 발톱이 5개가 아니라 4개인 점에 주목했다.
발톱이 5개인 오조룡(五爪龍)은 명나라 때부터 황제의 전용 문양으로 여겨졌으며 발톱을 하나 줄인 사조룡(四爪龍)은 황제가 신하에게 하사하는 옷의 문양으로 인식돼 왔다.
조선시대에도 왕과 왕비의 복식에는 오조룡 문양을, 세자와 세자빈의 복식에는 사조룡 문양을 장식했다고 한다.
2001년 경복궁 근정전 공사 과정에서 나온 용 그림 부적과 비교해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궁궐에 화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만든 부적은 1867년 경복궁 근정전을 중건할 당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적 속 용의 발톱은 5개인데, 그 모습 또한 쌍룡도의 용과는 다르게 생겼다.
박 학예연구사는 "쌍룡도 벽화는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던 궁중 화풍과 차이를 보인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본래 어좌 위를 장식했던 벽화는 (1915년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물산공진회때 사정전을 '박애관'으로 개조하면서 떼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기를 대략 1910년대 이후로 추정했다.
다만 박 학예연구사는 쌍룡도 그림을 둘러싼 구조는 경복궁 중건 당시에 제작된 것이 맞는다고 봤다.
그림을 부착한 장지에는 앞뒤로 종이를 배접(褙接·종이, 헝겊 또는 얇은 널조각 따위를 여러 겹 포개어 붙임)했는데, 여기에는 과거 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의 답안지가 쓰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 학예연구사는 "사진을 통해 내용을 판독한 결과 1866년 3월 열렸던 과거의 시제에 따라 작성한 답안으로 추정 가능했다"며 "당시 궁궐에서는 이런 '낙폭지'(落幅紙) 보관과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복궁 중건 당시부터 왕의 자리인 어좌 위를 그림으로 장식하기 위해 두 기둥 사이에 커다란 장지를 설치해 놓았음을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보고 있는 궁궐은 건립 초기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궁궐이 겪어온 역사를 바르게 알고, 변형 과정을 규명·기록하는 것 역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